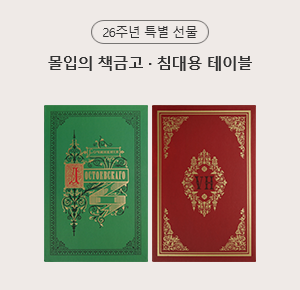|
강동수1961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몽유 시인을 위한 변명」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소설집 『몽유 시인을 위한 변명』 『금발의 제니』 『언더 더 씨』 『공 마에의 한국 비망록』, 장편소설 『제국익문사』(전 2권) 『검은 땅에 빛나는』, 산문집 『가납사니의 따따부따』 등을 펴냈다. 봉생문화상 문학상, 교산허균문학상, 오영수문학상, 요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
모두보기
  수상내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