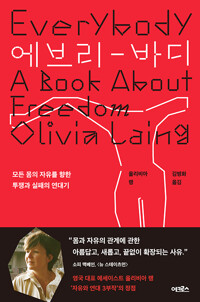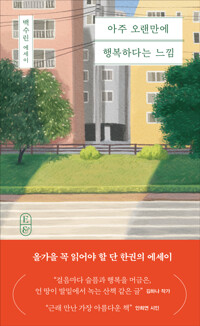인구 300만에 육박하는 광역시의 시장, 황선호의 보스는 "쩗지는 않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야."라고 말하며 그의 떠남을 승인, 혹은 종용했다. 시장의 뇌물 스캔들을 둘러싼 모든 과오를 뒤집어쓰고 잠적, 실종될 역할이 황선호의 역할. 5개월 29일 뒤의 광역시장 재선이 있기 전까지 그는 '하늘빛이 투명하고 태양빛이 순수한' 보보민주공화국으로 숨기로 했다. 식민 지배, 군부 쿠데타, 종교 갈등, 난민, 뜨거운 기후 등을 이유로 교민조차 없는 곳이다. 왜 하필 나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국의 이방인이 되어 햇볕 아래로 숨어든다.
"그런데 왜 그여야 했을까?"(28쪽)라는 질문을 붙잡고 황선호는 배회한다. 왜 "하늘빛이 투명하고 태양빛이 순수"하다는 보보를 묘사한 문장은 그에게 다가왔을까? 전작인 장편소설 <사랑의 생애>부터 연작 소설 <사랑이 한 일>까지, 필멸과 필연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져온 이승우의 소설이 고독하고 낯선 공간에서 그 질문을 이어간다. 외부인은 두통을 겪고, 비자를 받아야 하고, 수용소에 머물러야 한다. 검은색 머리와 눈동자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의 내부인인 것은 필연일까? 외부인에 대한 경계는 정당한가? 오래 닫혀있던 국경이 조금씩 열리는 지금, 이국을 상상하는 일은 지금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될 것이다. - 소설 MD 김효선
"그런데 왜 그여야 했을까?"(28쪽)라는 질문을 붙잡고 황선호는 배회한다. 왜 "하늘빛이 투명하고 태양빛이 순수"하다는 보보를 묘사한 문장은 그에게 다가왔을까? 전작인 장편소설 <사랑의 생애>부터 연작 소설 <사랑이 한 일>까지, 필멸과 필연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져온 이승우의 소설이 고독하고 낯선 공간에서 그 질문을 이어간다. 외부인은 두통을 겪고, 비자를 받아야 하고, 수용소에 머물러야 한다. 검은색 머리와 눈동자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의 내부인인 것은 필연일까? 외부인에 대한 경계는 정당한가? 오래 닫혀있던 국경이 조금씩 열리는 지금, 이국을 상상하는 일은 지금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될 것이다. - 소설 MD 김효선
이 책의 한 문장
그들은 잔뜩 웅크린 채 자기 발만 보고 다녔다. 사람들이 자기를 경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았다. 자기가 '외부인'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해보지 않은 생각이었다.
당연해야 마땅한 존재가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순간, 사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너무나 뻣뻣하고 딱딱해서, 누군가가 닿으면 쥐덫이 튕기듯 움찔"하는 몸 안에서 불행을 느끼던 올리비아 랭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나선다. 운동, 근육,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의 신체보다 그는 몸이라는 관념을 둘러싼 흐름에 관심이 있다. 몸이 지나온 역사, 그러니까 자유, 해방, 저항에 대한 이야기.
그가 파헤치는 이야기들의 중심엔 빌헬름 라이히가 있다. 몸과 자유의 관계를 평생 연구한 라이히로부터 올리비아 랭은 여러 사상가, 활동가, 예술가를 끌어내고 이들의 사유와 삶의 궤적을 엮어 보인다. 질병과 삶의 유한함, 피임과 임신 중단, 인종주의와 폭력의 주제가 돌돌 풀려나온다. 랭이 이 이야기들을 넘나드는 동안 몸은 자유의 억압물이고, 기억의 보관소이고,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이 된다. 존재하는 순간부터 함께였던 우리의 당연한 몸을 낯설고도 진지하게 살피게 하는 책이다. - 인문 MD 김경영
그가 파헤치는 이야기들의 중심엔 빌헬름 라이히가 있다. 몸과 자유의 관계를 평생 연구한 라이히로부터 올리비아 랭은 여러 사상가, 활동가, 예술가를 끌어내고 이들의 사유와 삶의 궤적을 엮어 보인다. 질병과 삶의 유한함, 피임과 임신 중단, 인종주의와 폭력의 주제가 돌돌 풀려나온다. 랭이 이 이야기들을 넘나드는 동안 몸은 자유의 억압물이고, 기억의 보관소이고,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이 된다. 존재하는 순간부터 함께였던 우리의 당연한 몸을 낯설고도 진지하게 살피게 하는 책이다. - 인문 MD 김경영
이 책의 한 문장
우리는 모두 몸속에 갇혀 있는데, 이는 그 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허용되며 금지되는지에 대해 상충하는 생각들의 그리드 안에 붙들려 있다는 뜻이다. 자유란 우리가 갖게 된 몸이라는 범주에 의해 파괴되는 일 없이, 혹은 방해받거나, 발이 묶이는 일 없이 살아갈 방식을 찾는 문제이기도 하다. -5장 ‘찬란한 그물’ 중에서
소설가 백수린의 산문집이 2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작가가 수년 전 높은 언덕 위 낡고 작은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긴 시간에 걸쳐 틈틈이 써온 산문을 엮은 것으로, 창비 ‘에세이&’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기도 하다. 혼자의 공간에서 혼자의 시간을 채운 편린들이 한 편 한 편의 글로 단정히 기록되어 있다.
작가는 옛 성곽이 보이는 풍경에 반하고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했다. 높은 언덕과 폭이 좁은 골목, 방 안까지 흘러들어오는 각종 외부 소음, 무례한 이웃 등 얼마간의 불편이 따르지만, 다정한 M이모, 살뜰한 E언니, 인생의 첫 강아지 봉봉, 무심히 챙겨주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같은 따스한 존재 덕분에 행복의 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었다. 작가는 이해와 사랑의 시선을 담아 집과 동네에 찬찬히 스며들어가는 여정을 촘촘하게 그려 보인다. - 에세이 MD 송진경
작가는 옛 성곽이 보이는 풍경에 반하고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했다. 높은 언덕과 폭이 좁은 골목, 방 안까지 흘러들어오는 각종 외부 소음, 무례한 이웃 등 얼마간의 불편이 따르지만, 다정한 M이모, 살뜰한 E언니, 인생의 첫 강아지 봉봉, 무심히 챙겨주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같은 따스한 존재 덕분에 행복의 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었다. 작가는 이해와 사랑의 시선을 담아 집과 동네에 찬찬히 스며들어가는 여정을 촘촘하게 그려 보인다. - 에세이 MD 송진경
추천사
걸음마다 슬픔과 행복을 머금은, 언 땅이 발밑에서 녹는 산책 같은 글이다. - 김하나 (작가)
책장을 덮은 뒤에도 내내 환하고, 구들 같은 온기가 이어진다. 덕분에 나 또한, 아주 오랜만에 충만하다는 느낌. 근래 만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 안희연 (시인)
책장을 덮은 뒤에도 내내 환하고, 구들 같은 온기가 이어진다. 덕분에 나 또한, 아주 오랜만에 충만하다는 느낌. 근래 만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 안희연 (시인)
한 남자의 뒷모습으로 시작하는 <우화>는 제목 외의 단 한 줄의 글도 등장하지 않는다. 책을 펼치면 양쪽 페이지에 같은 사람, 같은 동작의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 첼로를 연주하는 여자의 동작과 아이를 때리고 있는 여자의 동작, 총을 맞고 양팔을 벌리고 있는 남자의 동작과 노래를 열창하며 양팔을 벌리고 있는 남자의 동작은 동일하다. 같은 동작에 대비되는 다른 상황은 작가가 의도한 장치지만 작가는 대비되는 형태 자체로 독자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우화>는 작가가 '창작의 조국' 한국에서 선보이는 '글자 없는 첫 그림책'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생각의 시작점을 찍고 싶었다고 말하는 작가는 독자의 방대한 상상력을 통해 이 책이 한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을 빌려 글을 마치고자 한다. "간단한 상징을 통해 인간의 운명에 대한 보편적 진실을 말하고 싶다. 서사 전체가 열려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독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나의 그림책 세계로 초대한다." - 유아 MD 김진해
<우화>는 작가가 '창작의 조국' 한국에서 선보이는 '글자 없는 첫 그림책'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생각의 시작점을 찍고 싶었다고 말하는 작가는 독자의 방대한 상상력을 통해 이 책이 한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을 빌려 글을 마치고자 한다. "간단한 상징을 통해 인간의 운명에 대한 보편적 진실을 말하고 싶다. 서사 전체가 열려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독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나의 그림책 세계로 초대한다." - 유아 MD 김진해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우경 사업자등록 201-81-23094 통신판매업신고 2003-서울중구-01520 이메일 privacy@aladin.co.kr 호스팅 제공자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본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Aladin Communic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