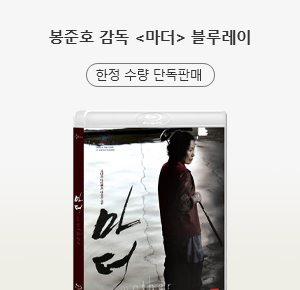긴 식탁 위에 불안정하게 솟은 나뭇가지 위로 책, 옷걸이, 커피잔, 주전자 같은 살림살이가 걸려 있다. 식탁 맞은편 의자엔 빨간색 새가 앉아 있다. 갑자기 새의 색이 사라진다. 색을 잃은 새가 식탁보를 움켜쥐고 날아간다. 여지없이 식탁 위에 모든 것이 와장창 부서진다. 화자는 어쩔 도리 없이 그 새를 쫓아간다. 계속 망가진 그곳에 앉아있을 수 없으므로.
글 없는 그림책인 이 책의 작가, 이사 와타나베는 일본에서 페루 북부로 이주한 이주민 3세이다. 낯선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전작 <이동>에 이어 이번 <킨츠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부서지는 마음들에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다. 킨츠기는 깨진 도자기를 옻으로 이어 붙이고 금분으로 장식하는 공예 기법이다. 전혀 다른 그림의 찻잔 반쪽과 반쪽을 이어 붙여 금으로 장식한다. 어찌 그것이 예전의 모습보다 별로라 할 수 있을까? 깨진 마음이 붙은 이음새는 빛난다. 그 안에 희망, 그리고 새 삶이 있다. 2024년 볼로냐 라가치상 대상작. - 유아 MD 임이지
글 없는 그림책인 이 책의 작가, 이사 와타나베는 일본에서 페루 북부로 이주한 이주민 3세이다. 낯선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전작 <이동>에 이어 이번 <킨츠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부서지는 마음들에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다. 킨츠기는 깨진 도자기를 옻으로 이어 붙이고 금분으로 장식하는 공예 기법이다. 전혀 다른 그림의 찻잔 반쪽과 반쪽을 이어 붙여 금으로 장식한다. 어찌 그것이 예전의 모습보다 별로라 할 수 있을까? 깨진 마음이 붙은 이음새는 빛난다. 그 안에 희망, 그리고 새 삶이 있다. 2024년 볼로냐 라가치상 대상작. - 유아 MD 임이지
북트레일러
지방 소멸, 고령화, 인구감소…남의 일 같지 않은 우리 사회의 암담한 현실이지만, 일단은 소설의 이야기다. 네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병해 인구 6만을 유지하고 있는 난하카마시에는 모든 주민이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요양센터로 떠난 후 아무도 살지 않게 된 마을 ‘미노이시’가 있다. 새롭게 취임한 시장은 타지역에서 이사 오는 주민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I턴 프로젝트’를 시작, 업무를 전담할 ‘소생과’를 신설하며 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공무원 만간지는 소생과로의 전보를 일종의 좌천이라고 여기면서도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을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과연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요네자와 호노부가 드물게 선보이는 사회파 미스터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를 부흥시키려는 공무원과 희망을 안고 이주해 온 주민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작가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재치 있는 필치로 담아냈다. 책은 어찌 보면 소소하고 또 우연의 일치에 불과해 보이는 일군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단편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종장에 이르러 그 모든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 우연이 아니고, 호의로 보인 것이 호의가 아님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놀랍고도 씁쓸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현대 사회의 병폐를 미스터리의 형식으로 담아낸 작가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작가가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다. 그야말로 나의, 우리의 ‘비극’이다. - 소설 MD 박동명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요네자와 호노부가 드물게 선보이는 사회파 미스터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를 부흥시키려는 공무원과 희망을 안고 이주해 온 주민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작가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재치 있는 필치로 담아냈다. 책은 어찌 보면 소소하고 또 우연의 일치에 불과해 보이는 일군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단편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종장에 이르러 그 모든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 우연이 아니고, 호의로 보인 것이 호의가 아님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놀랍고도 씁쓸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현대 사회의 병폐를 미스터리의 형식으로 담아낸 작가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작가가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다. 그야말로 나의, 우리의 ‘비극’이다. - 소설 MD 박동명
이 책의 첫 문장
날숨도 얼어붙을 듯한 새벽, 올해로 100세인 노인 여성이 숨을 거뒀다.
이 책의 한 문장
“네 말도 알겠지만, 순서가 틀렸어. 사람이 경제적 합리성에 봉사해야 하는 게 아니야. 경제적 합리성이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는 거야. 경제적 합리성을 앞세운다면 노예제도도 아파르트헤이트도 합리적이겠지.”
스무 살의 나는 하루에도 아홉 번씩 죽었다
서른 살의 나는 이따금 생각나면 죽었다
마흔 살의 나는 웬만해선 죽지 않는다
<시인하다>
시인으로 20년을 보낸 박연준이 5년 만에 다섯 번째 시집을 냈다. 산문 <듣는 사람>(2024), <고용한 포옹>(2023)과 소설 <여름과 루비>(2022)등을 발표하며 시의 안팎을 오가는 사이 스무 살에서 마흔 살로 시간이 갔다. 많은 죽음이 지나가니 '하루에도 아홉 번씩' 죽던 마음은 이제 '웬만해선 죽지 않는다'.
유별난 슬픔이 잔잔해진 곳에서 화자는 이제 작은 것들을 본다. '이제부터// 작은 것에만 복무하기로 한다'(<유월 정원>)는 다짐으로 살아남은 자의 책무인 것처럼 작은 것들과 눈을 맞춘다. 절절 끓는 이에겐 부드러워질 시간이 기필코 올 것임을, 이미 액체로 녹은 이에겐 더 작아지고 더 순해져 기화할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감하는 말과 함께 시의 리듬으로 말소리가 나직나직 작아진다.
끓여서, 잊는 거죠
질긴 시간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감각이 액체로 녹을 때까지
<나는 당신의 기일(忌日)을 공들여 잊는다> - 시 MD 김효선
서른 살의 나는 이따금 생각나면 죽었다
마흔 살의 나는 웬만해선 죽지 않는다
<시인하다>
시인으로 20년을 보낸 박연준이 5년 만에 다섯 번째 시집을 냈다. 산문 <듣는 사람>(2024), <고용한 포옹>(2023)과 소설 <여름과 루비>(2022)등을 발표하며 시의 안팎을 오가는 사이 스무 살에서 마흔 살로 시간이 갔다. 많은 죽음이 지나가니 '하루에도 아홉 번씩' 죽던 마음은 이제 '웬만해선 죽지 않는다'.
유별난 슬픔이 잔잔해진 곳에서 화자는 이제 작은 것들을 본다. '이제부터// 작은 것에만 복무하기로 한다'(<유월 정원>)는 다짐으로 살아남은 자의 책무인 것처럼 작은 것들과 눈을 맞춘다. 절절 끓는 이에겐 부드러워질 시간이 기필코 올 것임을, 이미 액체로 녹은 이에겐 더 작아지고 더 순해져 기화할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감하는 말과 함께 시의 리듬으로 말소리가 나직나직 작아진다.
끓여서, 잊는 거죠
질긴 시간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감각이 액체로 녹을 때까지
<나는 당신의 기일(忌日)을 공들여 잊는다> - 시 MD 김효선
이 책의 한 문장
공책을 펼치면 거기
작은 인간을 위한 광장
납작하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이름들
사소한 명단이 걸어다닌다
작은 이름표를 달고 작게 작게
수없이 보고 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대로 알고 가는 여행과 발 닿는 대로 가는 여행, 개개인의 취향대로 고르면 되는 부분이라 어느 쪽이 더 좋고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 다만, 역사와 문화를 습득한 후라면 여행의 방향이 달라지고,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에 시선을 두게 되면서 경험의 영역이 확장된다.
마음먹으면 언제든 가볼 수 있는, 우리 곁의 궁궐. '걷고, 보고, 느끼고 상상하며 궁궐을 더 재밌게 탐험하는 법'을 알려주는 <어린이 궁궐 탐험대> 시리즈가 출간되었다. 그 첫 권의 장소는 경복궁이다. <궁궐 걷는 법>의 저자 이시우 작가와 서평화 그림작가가 뭉쳤다. 포실하고 귀여운 고양이가 등장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함께 경복궁의 곳곳으로 안내한다. 탐험 미션과 주제 탐험 코스 안내까지 알차게 담았다.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볼륨감인 데다, 책의 재킷을 펼치면 경복궁 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 어느 곳으로든 가보고 싶게 만드는 이 계절, 어른들에게도 유익한 이 책을 들고 아이들과 탐험하면, 책 이전과 이후의 경복궁이 분명 다르게 와닿을 것이다. - 어린이 MD 송진경
마음먹으면 언제든 가볼 수 있는, 우리 곁의 궁궐. '걷고, 보고, 느끼고 상상하며 궁궐을 더 재밌게 탐험하는 법'을 알려주는 <어린이 궁궐 탐험대> 시리즈가 출간되었다. 그 첫 권의 장소는 경복궁이다. <궁궐 걷는 법>의 저자 이시우 작가와 서평화 그림작가가 뭉쳤다. 포실하고 귀여운 고양이가 등장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함께 경복궁의 곳곳으로 안내한다. 탐험 미션과 주제 탐험 코스 안내까지 알차게 담았다.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볼륨감인 데다, 책의 재킷을 펼치면 경복궁 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 어느 곳으로든 가보고 싶게 만드는 이 계절, 어른들에게도 유익한 이 책을 들고 아이들과 탐험하면, 책 이전과 이후의 경복궁이 분명 다르게 와닿을 것이다. - 어린이 MD 송진경
이 책의 한 문장
건물 한 곳만 보고 돌아가려다가도 바로 옆 다른 건물과 나무, 연못, 언덕 등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궁궐이랍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났다 헤어지게 될 테고요. 그러니 궁궐이야말로 조선의 500년 역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현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우경 고객정보보호 책임자 최우경 사업자등록 201-81-23094 통신판매업신고 2003-서울중구-01520 이메일 privacy@aladin.co.kr 호스팅 제공자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본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Aladin Communic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