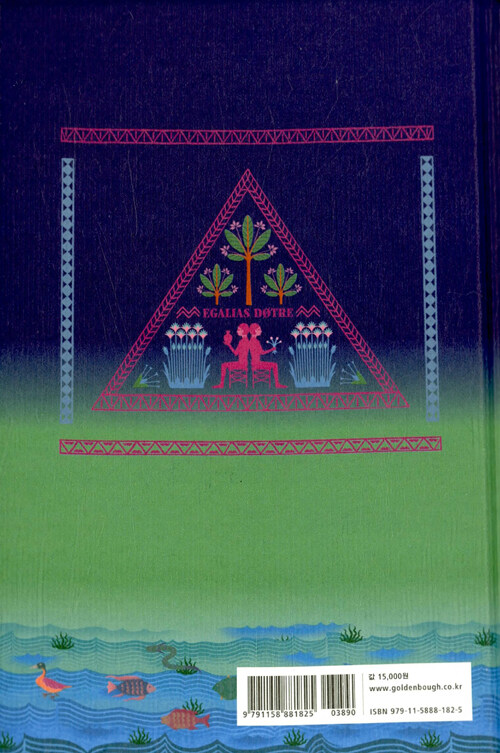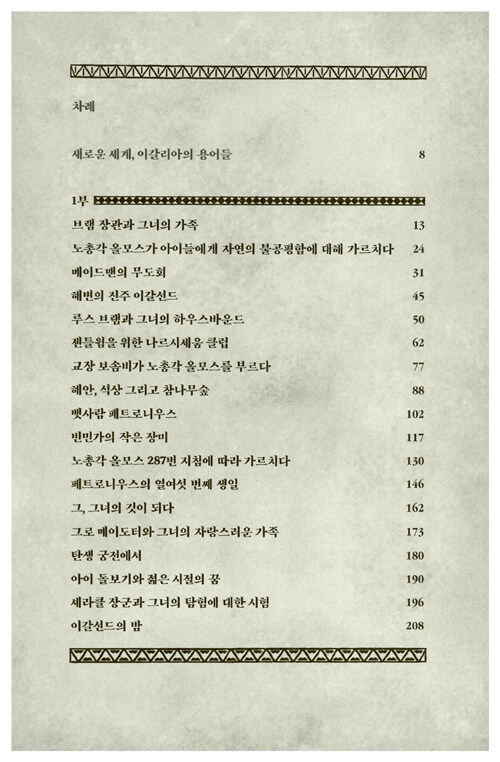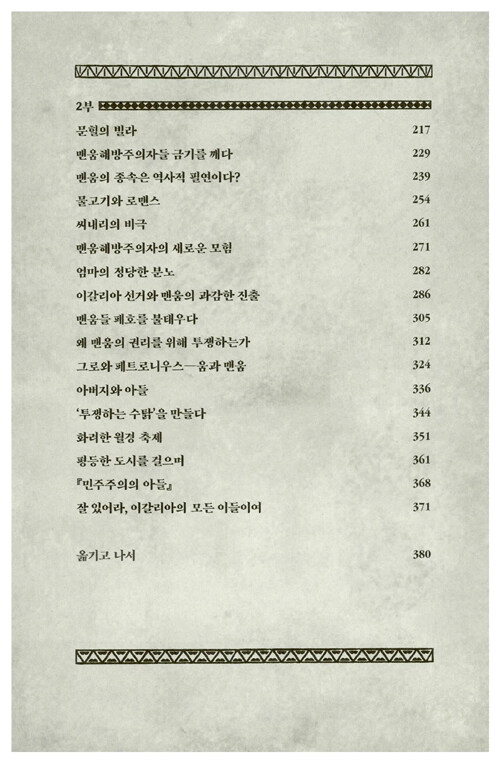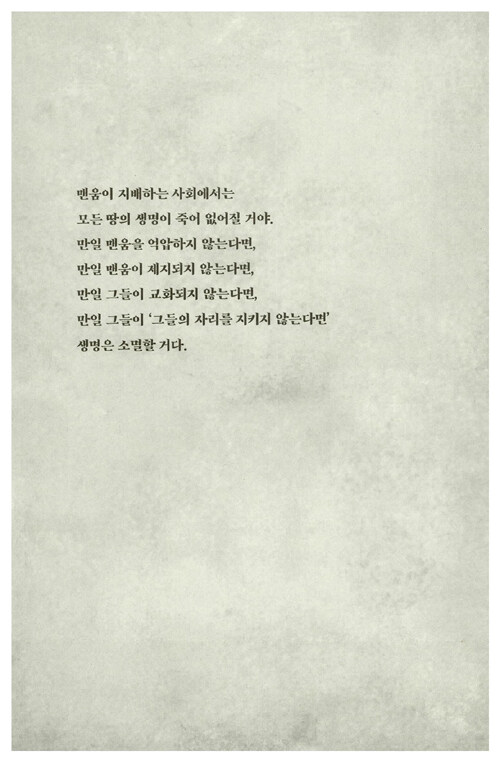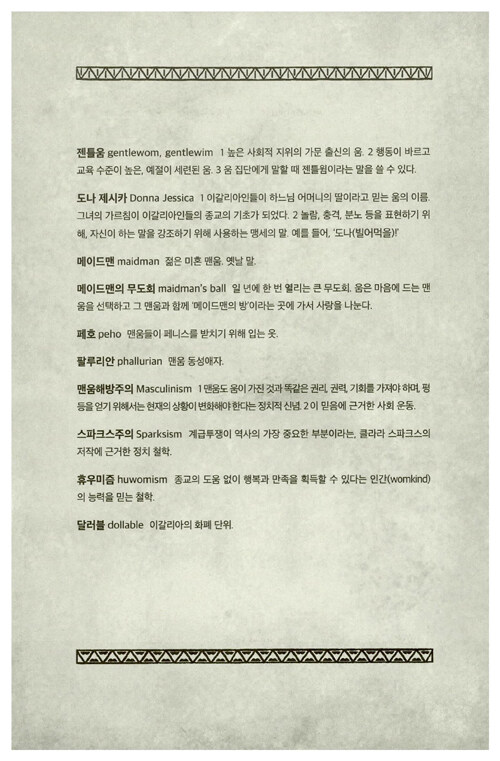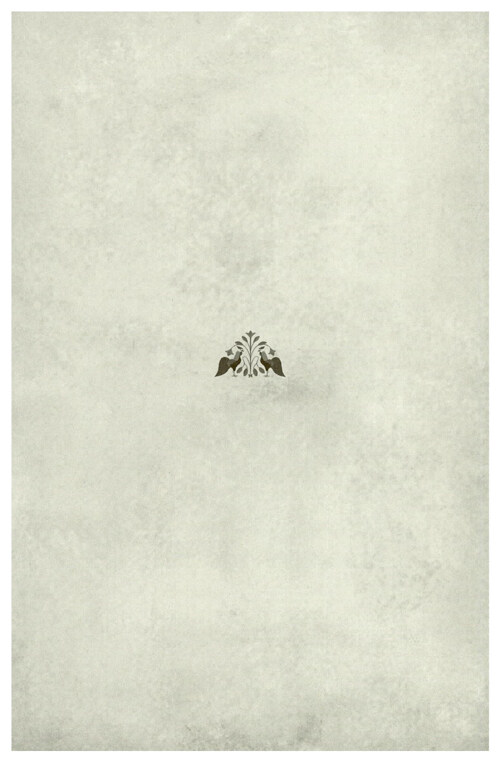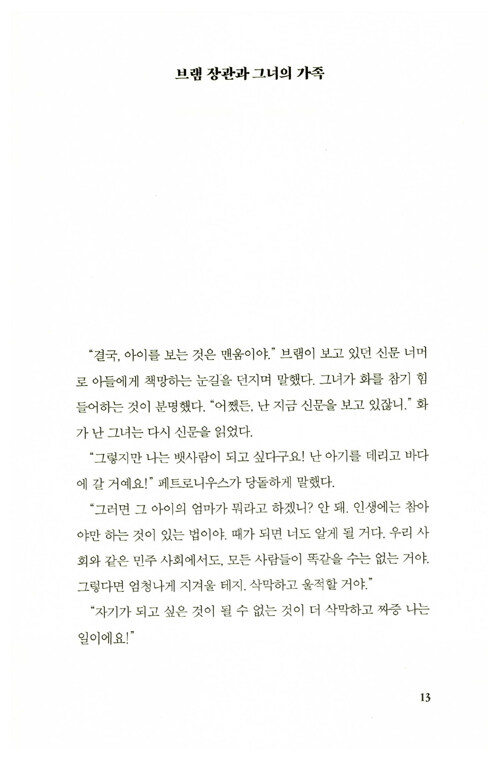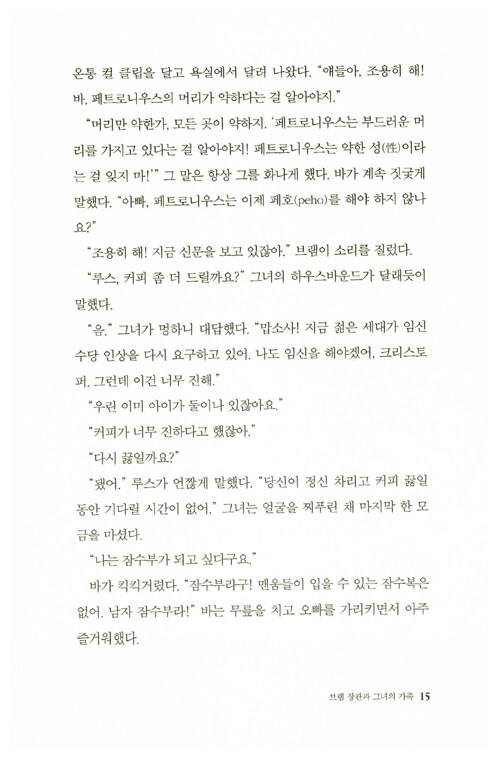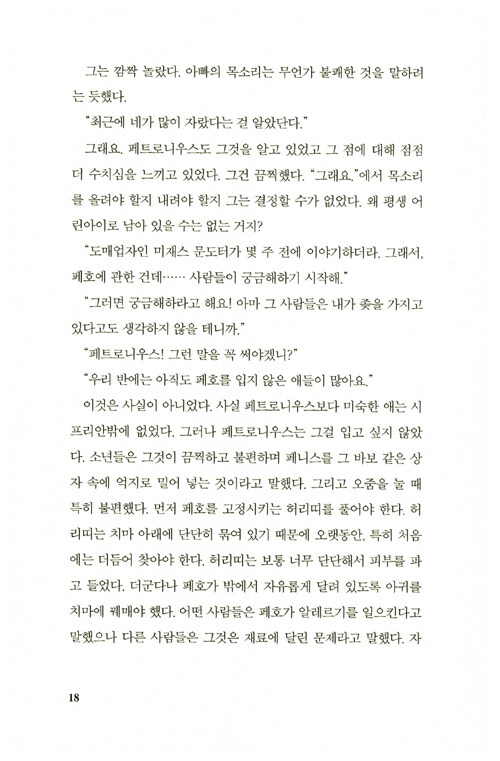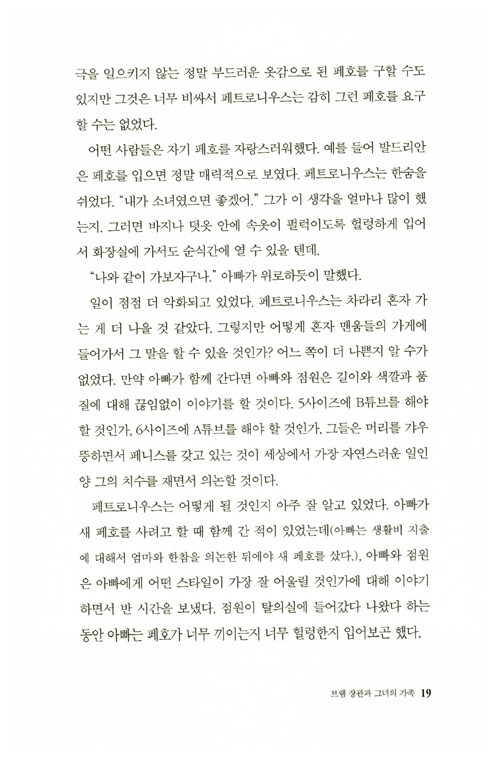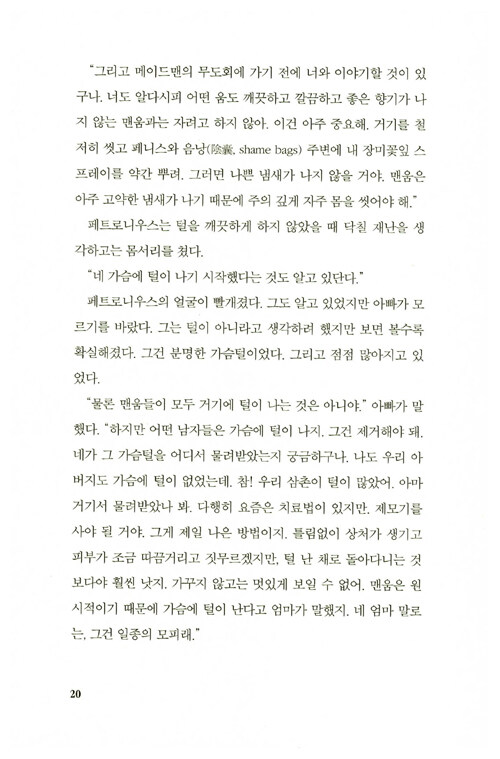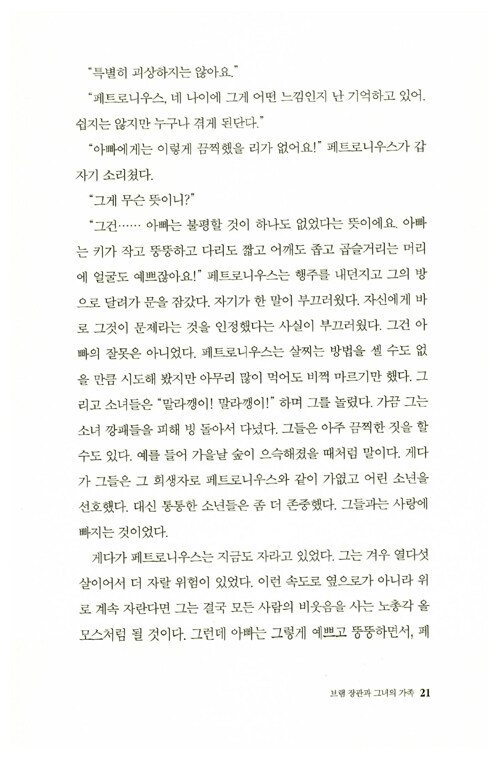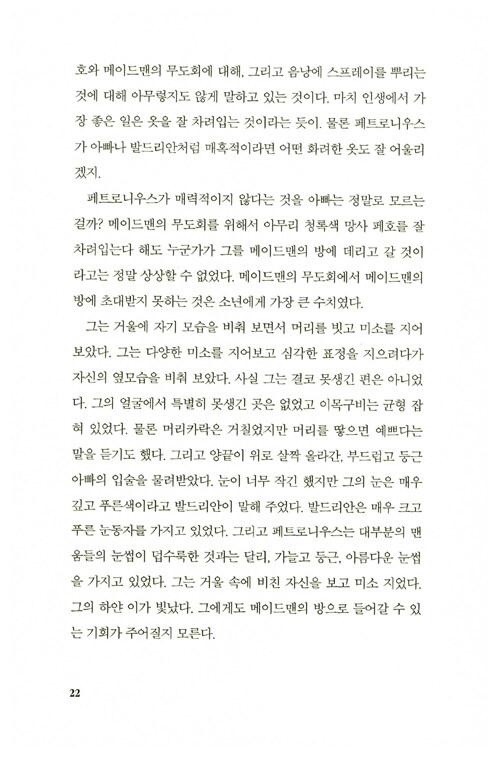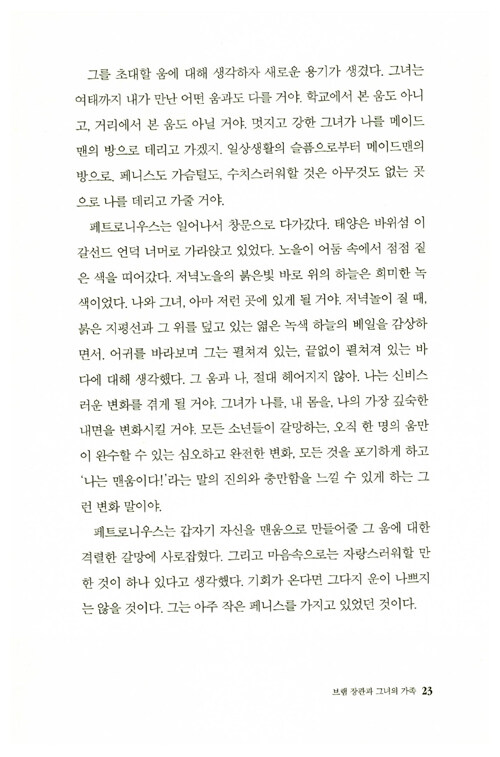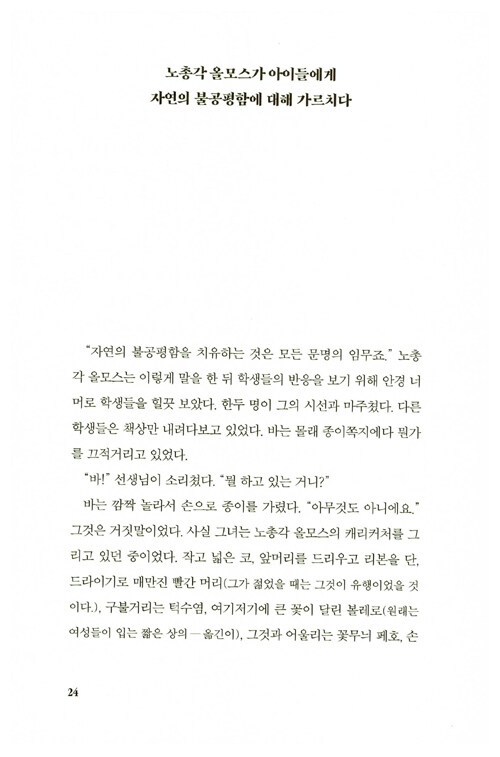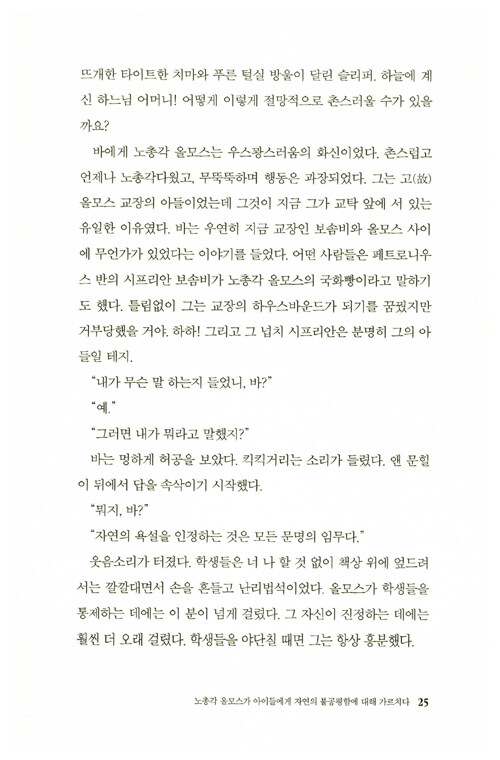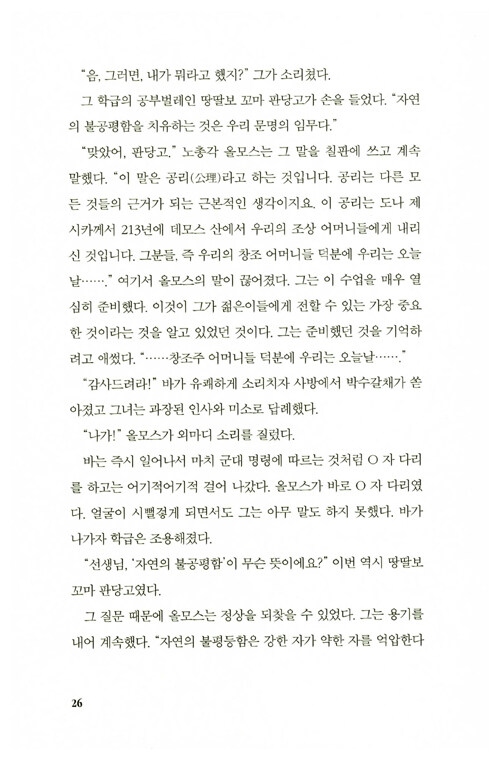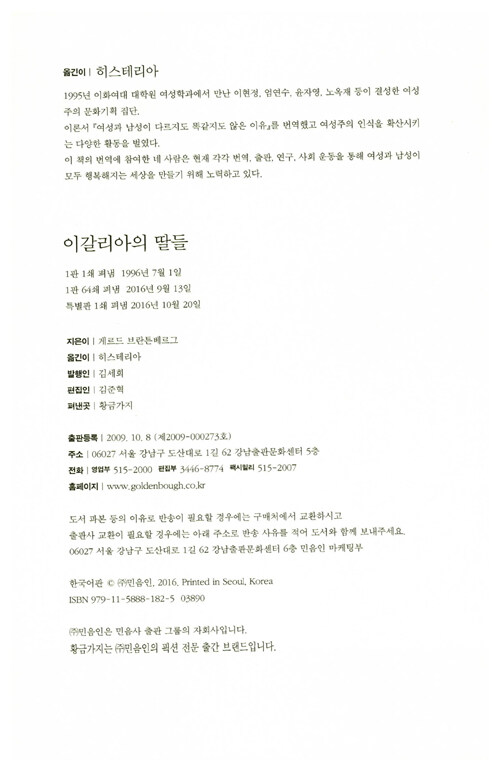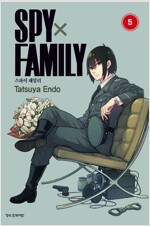- 이 광활한 우주점 소득공제
-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지은이),히스테리아 (옮긴이)황금가지2016-10-21원제 : Egalias Dotre
이전
다음
- 배송료2,500원 (전주점 상품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 출고예상일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출고 가능
- [중고] 이갈리아의 딸들 (특별판, 양장)
- 9,200원 (정가대비 39% 할인) [중고-상]
- 해외배송, 도서산간, 군부대 배송 불가, 선물포장불가
판매자
편집장의 선택
편집장의 선택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충격적인 소설"
나는 처음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책을 들고 다녔다. 그러면서 몇몇 여성 친구들에게 소설 속의 장면들을 읽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펼쳐 보인 부분들을 읽은 친구들은 예외 없이 웃었다. 내가 어땠냐고 묻기 전에 내게 먼저 이 소설의 감상을, 정확히는 소설을 읽고 난 뒤에 기분이 어땠는지 묻는 친구도 있었다. 나는 웃기긴 한데 좀 쓴웃음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대략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많은 여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렇지만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움(여성)들이 맨움(남성)들을 종속된 존재로 취급한다는 설정 자체는 그다지 놀라울 게 없다. 여성과 남성의 입장을 바꿔 보자는 말도 마찬가지다. 너무 간단한 설정이다. 그런데 <이갈리아의 딸들>은 이와 같은 설정을 낱낱의 에피소드로 분해해 직접 시연해 보인다. 이갈리아의 남성들은 (지구 여성의 브래지어와 유사한 기능의) 음낭 보호대를 (지구 여성이 브래지어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차고 다닌다. 그 위로는 화려하고 화사한 색의 치마를 두른다. 화장도 하고 수염도 늘 손질해서 예뻐 보여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좋아해주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직접 움직이는 역동적인 일들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들에게 도전하는 자가 예쁜지 아닌지 관심이 없다. 다만 남자들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직접 도전할 수 없고 여성에게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여성의 취향에 맞게 자신을 꾸며야 한다.
겁이 많고 소심하고 인형 놀이나 하는 남자들은 선원이나 모험가가 될 수 없다. 이는 실제 개개인이 지닌 능력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그냥 남자는 원래 그런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 페트로니우스는 선원이 되고 싶어 하지만 주위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결국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녀보다 낚시를 잘 하는 것도 숨기고(여성은 자신이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지면 싫어한다), 주장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면서 이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왜냐면 늘 남자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배워 왔으니까), 심지어 폭행을 당하면서도 연인의 품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이갈리아의 남자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그녀는 자신을 때리긴 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갈리아의 딸들>은 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소설이라기보다는 꼼꼼하게 기획된 설정집에 가깝다. 그러나 그 설정의 힘은 출간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당연히 불평등은 안 좋은 거지”라며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추상적인 불평등 개념을 낱낱의 사건 속에 부려놓아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 책을 읽은 누군가는 쓴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정말로 웃었고, 또 누군가는 화를 내거나 불쾌해했다. 나는 지금껏 이 책을 읽고 난 뒤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았지만 지금껏 이 책이 그냥 시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는 <이갈리아의 딸들>의 성역할 반전이 가져다주는 충격이 아직까지도 굳건히 상존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갈리아의 딸들>의 거울상인 ‘지금 이곳의 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놀라울 정도로 쉽게 고발한다.
이 소설은 페미니즘의 어떤 노선을 가리키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또한 예견도 전망도 하지 않는다. <이갈리아의 딸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지금 존재하는 것들만을 보여준다. 그렇다보니 이 책이 페미니즘 입문서로 회자되는 점을 들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불쾌한 소동극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낯선(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불쾌함이야말로 각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주의주장을 검토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현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야말로 모든 사회적 행위들이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갈리아의 딸들>은 여전히 위력적인 책이다. 나는 이 책이 더 많이 읽히기를 바란다. 동시에 이 책을 새로 읽게 될 모든 이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농담처럼 웃고 넘기는 세상이 좀더 일찍 찾아오기를 바란다.
- 소설 MD 최원호 (2016.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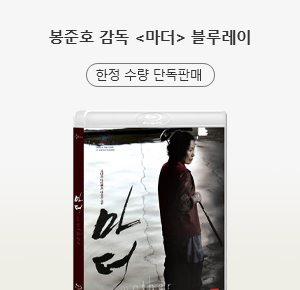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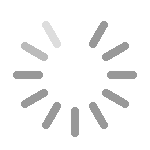



![[중고] 이갈리아의 딸들 (특별판, 양장)](https://image.aladin.co.kr/product/9593/9/cover500/k052535539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