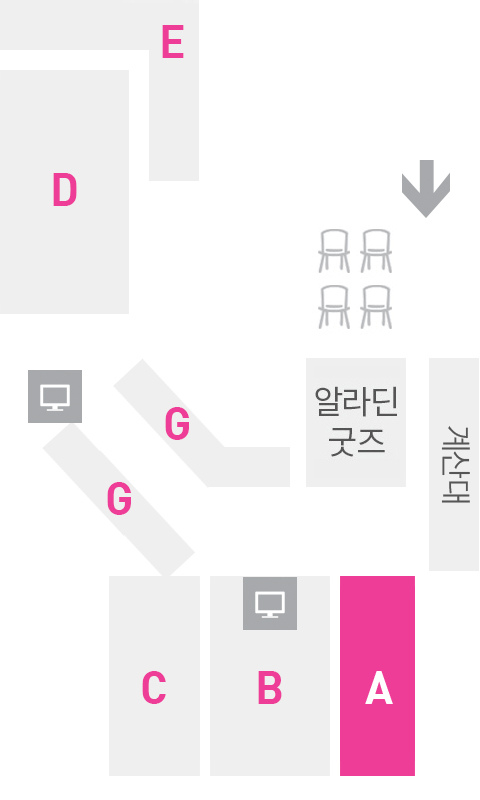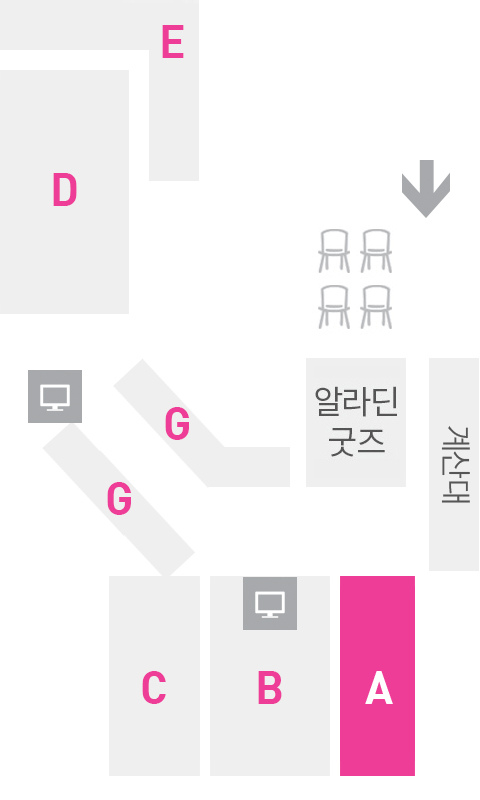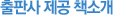저자는 광화문 무국적 술집 '몽로'와 서교동의 '로칸다 몽로'를 오가면서 요리를 하는 주방장이다. 남들은 '셰프'라고 부르지만 그는 한사코 'B급 주방장'이라고 말한다. 매일매일 광화문과 서교동을 오가면서 면벽수도 하듯이 제철 재료로 박찬일식 요리를 한다. 틈나는대로 세상의 먹거리와 먹고 사는 일을 소재로 글을 쓴다.
그가 먹고 사는 일의 지엄함을 얘기한 에세이집 <미식가의 허기>를 펴냈다. 이 책은 그동안 경향신문에 연재한 '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을 토대로 엮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의 주방장으로서 보고, 느끼고, 만져본 이야기를 때로는 뜨거운 돼지국밥처럼, 때로는 맛있는 닭튀김처럼 쫄깃한 문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책은 요리에 대한 가이드북도, 대단한 요리철학이 담긴 이론서도 아니다. 이땅의 장삼이사들이 사계절의 뒷골목에서 고단한 삶을 잠시 쉬면서 위안을 삼아온 먹거리에 대한 헌사다. 또 그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바다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일하는 농부와 어부, 산꾼에 대한 기록이다. 그 신선한 재료로 수많은 음식점의 주방에서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일하는 주방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에세이다.
박찬일 (지은이)의 말
뜻하지 않게 책을 한 권 묶는다. 책을 내는 건 생계의 방책이니 부끄러움이 더하다. 먹고살자고 묻어버릴 글을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었다. 그렇다. 먹고살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아니 우리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말, 먹고살자는 문장을 쓴다. 먹고사는 일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탄생의 본질이다. 먹고살기 위해 배신하고, 거짓말 하고, 누군가를 죽인다. 먹고산다는 명분 아래서 협잡과 사기와 외면의 삶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먹고사는 일은 숙명적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말이다. 어느 누구도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러 먼지가 끼고, 벗겨지지 않은 낙인같은 때를 묻히고도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아침에 눈을 뜬다. 다들 먹고사는 일 앞에서 분노를 거두고 용서의 손을 내밀기도 한다. 달리 방법 없는 우리들의 한심함이 먹고산다는 문장을 구성하는 골격이다. 우리는 그 지난한 시절을 보내며 정신과 육체를 학대해왔다. 나는 냉면을 내리던 옛 제면 노동자의 무너진 어깨를 생각한다. 화상으로 가득한 요리사의 팔뚝을 떠올린다. 칼에 신경이 끊어진 어떤 도마 노동자의 손가락을 말한다. 그뿐이랴. 택시 운전사의 밥 때 놓친 위장과 야근하는 이들의 무거운 눈꺼풀과 학원 마치고 조악한 삼각김밥과 컵라면 봉지를 뜯는 어린 학생의 등을 생각한다. 세상사의 저 삽화들을 떠받치는 말, 먹고살자는 희망도 좌절도 아닌 무심한 말을 입에 굴려본다.
아비들은 밥을 벌다가 죽을 것이다. 굳은살을 미처 위로받지 못하고 차가운 땅에 묻힐 것이다. 다음 세대는 다시 아비의 옷을 입고 노동을 팔러 새벽 지하철을 탈 것이다. 우리는 그 틈에서 먹고 싸고 인생을 보낸다. 이 덧없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소주를 마시고, 먹는다는 일을 생각한다. 달리 도리 없는 막막함을 안주 삼아서.
책 안에 있는 글은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를 다루거나, 오랜 기억을 끄집어내어 만든 문장들이다. 유별나게 먹는 일의 현장음이 나는 아직도 귀에 생생하고 그 광경이 눈에 삼삼하다. 노인이 국숫발을 삼키는 장면이 그 어떤 슬픈 소설보다 더 선명하게 슬펐다. 그것을 잊을 수 없어 이 책에 녹아 있다. 나의 분별없는 시니컬함은 실은 슬픔이라는 질료로 이루어져 있다. 울 수 없어서 나는 냉소했는지 모른다. 그것을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어쩌다 제목에 미식가가 들어가지만, 내 미각은 실은 미식의 반대편에 있다. 거칠게 먹어왔고, 싼 것을 씹었다. 영양과 가치보다 주머니가 내 입맛을 결정했다. 함께 나누는 이들의 입맛이 그랬다. 소 등심 대신 돼지고기를 구웠고, 조미료 듬뿍 든 찌개에 밥을 말아 안주했으며, 노천의 국숫집에서 목숨처럼 길고 긴 국숫발을 넘겼다. 그것이 내 몸을 이룬 음식이니, 미식이란 가당찮다. 그럼에도 미식이라고 할 한 줄기 변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순전히 음식의 건실한 효용을 사랑했던 것이다. 가장 낮은 데서 먹되, 분별을 알려고 했다. 뻐기는 음식이 아니라 겸손한 상에 앉았다. 음식을 팔아 소박하게 생계 하는 사람들이 지은 상을 받았다. 그것이 미식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미식의 철학적 사유와 고급한 가치의 반대편에 있는 저 밥상들이 나는 진짜 미식이라고 생각한다.
프롤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