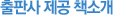첫 번째 시집 『아마도 아프리카』부터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시인 이제니의 첫 산문집 『새벽과 음악』이 출간되었다. ‘말들의 흐름’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자,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기도 하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2022년 현대문학상, 200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새벽과 음악> ,<전자적 숲; 더 멀리 도망치기> ,<사랑에 대답하는 시> … 총 37종 (모두보기) 200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아마도 아프리카』『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를 출간했다. 편운문학상 우수상, 김현문학패,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표면의 언어로써 세계의 세부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작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세계와 조금은 다른 세계, 조금은 넓고 깊은 세계에 가닿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 ‘새벽’과 ‘음악’ 아래서 밤새워 듣고 싶은 ■ 말들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