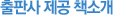유병재 (코미디언, 방송작가) 
: 그의 글이 단출해 좋다. 애써 멋 내지 않은 듯 보이지만 실은 그러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멋쟁이 단어들을 탈락시켰을지를 상상하면 웃길 것도 없는데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정서와 윤리의 백혈구”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그는 세상 그 어떤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보다도 치열했으리라.
낮에 모아 밤에 펼쳐냈을 단어들이 그의 선택을 받아 이 책에 담기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고 웃겼을까. 나는 문상훈이 아직 쓰지 않은 단어들이 부럽다.
우리 부모님이 3년 먼저 사랑을 나누셨다는 것을 이유로 그에게 윗사람 대접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보다 문상훈의 (거의) 최초의 팬임을 이제야 고백한다. 그렇기에 나는 문상훈이 쉬지 않고 썼으면 한다. 그가 취해야만 쓸 수 있는 작가라면 평생 주류를 무상 지원할 테고, 밤에만 쓸 수 있다 하면 1년 내내 동지(冬至)이길 빌겠다. 시인이 못하는 것들을 나눠서 해주고 싶다는 문상훈처럼 나도 그가 못하는 것을 나눠 해주고 싶다.
누구도 30초 이상 무언가를 보지 못한다는 시대에, 모두가 글자를 읽는 대신 챌린지를 하는 시대에 나는 문상훈의 글이 모기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어떤 알고리듬으로든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선택한 독자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한다.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을 그들과 이 책에서 동창회를 열고 싶다.
이슬아 (작가, 〈일간 이슬아〉 발행인) 
: 문상훈을 만나면 진짜 대화를 하게 된다. 우리는 방송꾼처럼, 그러니까 업자처럼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입에 발린 말과 하나마나한 소리 같은 건 저리 치워둔다. 그도 나도 젊지만 가짜 대화에 신물이 날 만큼은 살아본 것 같다. 문상훈이 처음으로 글을 보여준 날엔 심장이 무지 빨리 뛰었다. 그가 너무 귀엽고 슬퍼서, 청승이 너무나 정교하고 고와서 마음이 아팠다. 아끼고 싶은 아픔이었다. 글이 좋다고 내가 말하자 그는 답장을 계속 썼다 지웠다 했다. 그 망설임은 나 때문이 아니다. 나보다 훨씬 어려운 청중이 늘 그를 주시한다. 문상훈이라는 엄격한 청중 말이다.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문상훈이 자기 자신과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와서다.
뭘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냐는 타박을 들으며 그는 지내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늘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야 말았을 것이다. 꼴보기 싫은 자신을 징하게도 들여다보며 청춘을 백 번쯤 되살아본 것 같고 그러다가 아주 독특한 자의식들을 발명해낸 듯하다. 승화의 아이콘이 된 지금도 그는 알고 있다. 인생과 자기혐오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살아간다는 건 자신을 점점 더 미워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의 동료 작가 안담은 문상훈에 관해 이런 말을 했다. "모퉁이에 있었던 애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 문상훈이 아무리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가 모퉁이에서 왔다는 사실은. 그가 쓰는 문장을 단번에 이해할 또다른 모퉁이 인간들을 생각한다. 나 역시 모퉁이에서 그를 바라본다. 어떻게 유튜브를 냉소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문상훈이 웃기고 있는데. 어떻게 TV 앞에 앉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문상훈이 도망치며 울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문상훈을 봤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문상훈의 얼굴이 이 책에 있다. 내 인생은 문상훈의 재능과 고독을 바라보며 흘러간다.
김신식 (작가, 감정사회학자) 
: 문상훈은 각종 매체를 넘나들며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활약하다가도, 종종 소형 카메라를 켜놓고 시에 대한 애호를 범상치 않게 고백해왔다. 그럴 때마다 백 개가 넘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며 시 쓰기에 대한 갈망을 놓지 않은 페르난도 페소아를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재차 떠올린 적이 있다.
관련하여 문상훈의 글쓰기엔 어떤 고집이 느껴지는데, 이는 주변 광경을 세밀히 포착하고 타인과의 기억을 세심히 소환하는 기록 너머, 일정한 리듬을 갖춘 채 우리네 삶을 절묘하게 ‘이미지화’하는 시 구절 같은 단상을 낳는다. 처음엔 책 속 글귀를 쭈욱 낭독해보고픈 마음이 들다가 여러 번 읽을수록 시를 읊듯 한 줄 한 줄 낭송하고 싶어지는 이유다.
그가 은은하게 추구하는 형식미와 결합된 관계·젊음·죽음·행복·언어·감정 등에 대한 고찰을 따라가다 보면, ‘표류하는 자’의 미덕을 접하게 된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여행’이라고 밝히며 부지런히 본인을 탐색했던 페소아의 정신에 빙의한 문상훈 덕분에, 나는 가장 가깝고도 먼 여행지, 아직 다녀오지 못했기에 흥미로운 여행지가 바로 내 자신임을 새삼 곱씹게 됐다.
무엇보다 문상훈은 맛깔난 비유를 통해 타인과 자기 자신의 생활을 이리저리 되살펴 보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감흥을 공유한다. 여기엔 삶의 고된 지점을 마침내 극복했다는 표현을 경계한 채, 버거운 삶에 대처하는 묘수처럼 포장된 말들에 현혹되지 않으려는 저자의 결기가 담겨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책은 오늘의 다짐이 내일 급작스레 무너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어제 실컷 부정했던 생각들이 오늘따라 소중하게 다가오는 모순 속에서도 사람과 인생에 대한 ‘묘미’를 찾아 나서려는 이들에게 애정 있게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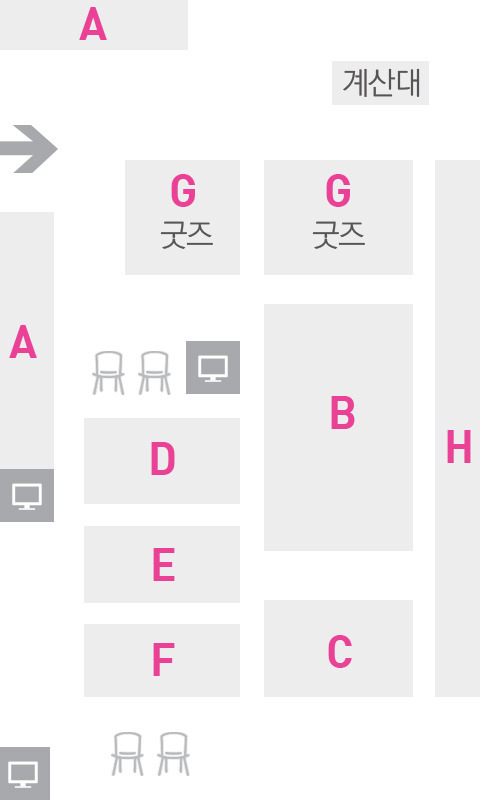
 최근작 :
최근작 : 소개 :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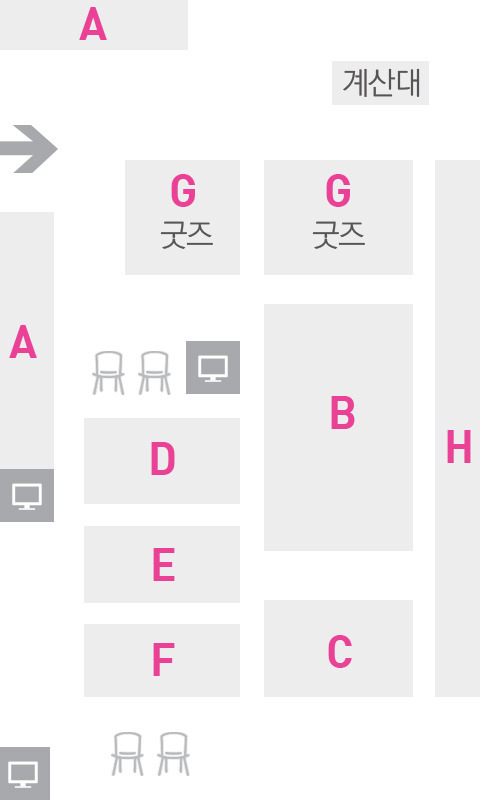
 최근작 :
최근작 : 소개 :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