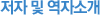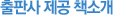사랑 얘기며, 동시에 한계 상황에 지배받는 인간의 얘기이다. 신과 인간, 성과 속, 초월과 욕망이라는 대립항 속에서 세속의 무게를 뛰어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노력이 사랑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굴절되어 나타나 성취 혹은 좌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인간이면서 인간 밖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러나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한 슬픈 상(像)에 관한 이야기다.
황혜련 (지은이)의 말
처음 이 소설을 구상할 때는 사제의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 쓸 생각이었다. 그러다 차츰 한계에 부딪혔다. 내가 안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기는 한가. 스스로 확신이 없었다. 소설이니까 작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은 안 통했다. 버리기 시작했다. 검증 안 된 종교적 견해와 다소 장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인공의 가정사, 그리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주인공의 고뇌를 최소화시켰다. 그러고나니 사랑이 남았다. 그래, 사랑만 하자. 사랑만 하기에도 얼마나 벅찬가. 그러나 그도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으며 왜곡된 사랑조차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모호함 속에서 정의를 내리는 일이 어려워질 때마다 나는 원고를 줄여나갔다. 자꾸만 줄이다 보니 원고의 반이 훌러덩 날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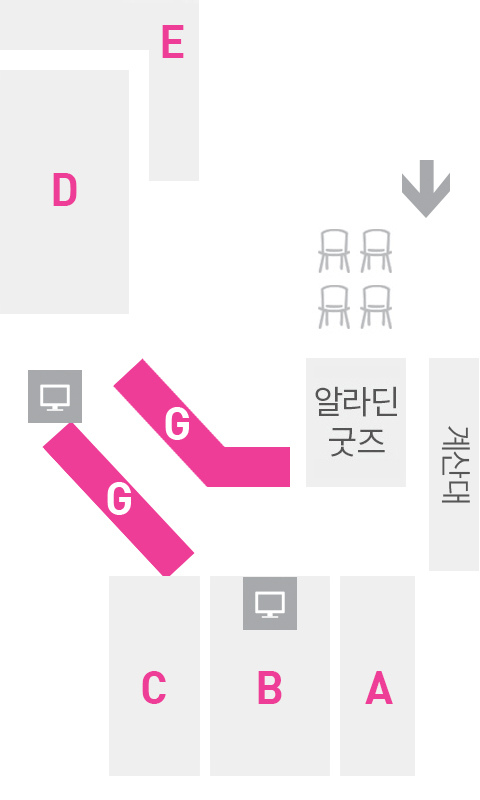
 최근작 :
최근작 : 소개 :
소개 :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