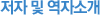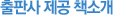문보영 (시인) 
: 《연민의 기록》은 에르베 기베르의 ‘투병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자신의 병을 지독하게 관찰하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 책을 ‘투병의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 그의 글쓰기는 죽음에 저항하는 글쓰기가 아니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그가 엄청나게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과 진정 결별하고 싶어하는지도 미지수다. 차라리 고통과 흥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흥정이 좋다. 그게 인생이니까.”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고통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대가로 그 풍경을 촬영하고, 기록하고 책으로 남긴다. 말도 안 되는 치료를 위해 카사블랑카로 떠날 때, 그는 과연 치유를 기대했을까. 차라리 취재를 위해 세상에 잠입한 기자처럼 보인다. 기베르는 병과 한 몸인 것처럼 괴로워하다가도 그것을 자신이 그려야 할 정물인 것처럼 바라본다.
그에게 글쓰기는 외로운 기쁨이자 삶과의 흥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중반부터는 모든 장이 마지막 같아서 울음이 터지는데 민망하게 다음 장이 남아 있다. 그러나 막상 마지막 장은 첫 장과 같이 시작을 예고한다. 그의 인생은 모든 날이 마지막 날 같고 진정 마지막 날은 태어난 날과 같다. 글쓰기는 에르베 기베르의 본업이고, 살아 있음은 그의 부업이었음을.

 최근작 :
최근작 : 소개 :
소개 : 최근작 :
최근작 : 소개 :
소개 :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