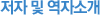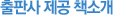시를 읽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럼, 산책을 한다는 건? 그건 어쩌면 고요한 하강과, 존재의 밑바닥에 고이는 그늘을 외면하지 않는 묵묵함의 다른 말일지도 모른다. 그건 결국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초록색 신호일 수도 있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내가 꿈꾸는 것과 내가 있는 것, “얼마나 끔찍할까요, 유명인이 된다는 건” ■ ‘말들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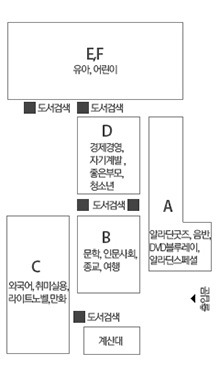
 최근작 :
최근작 : 소개 :
소개 :




 (0)
(0)